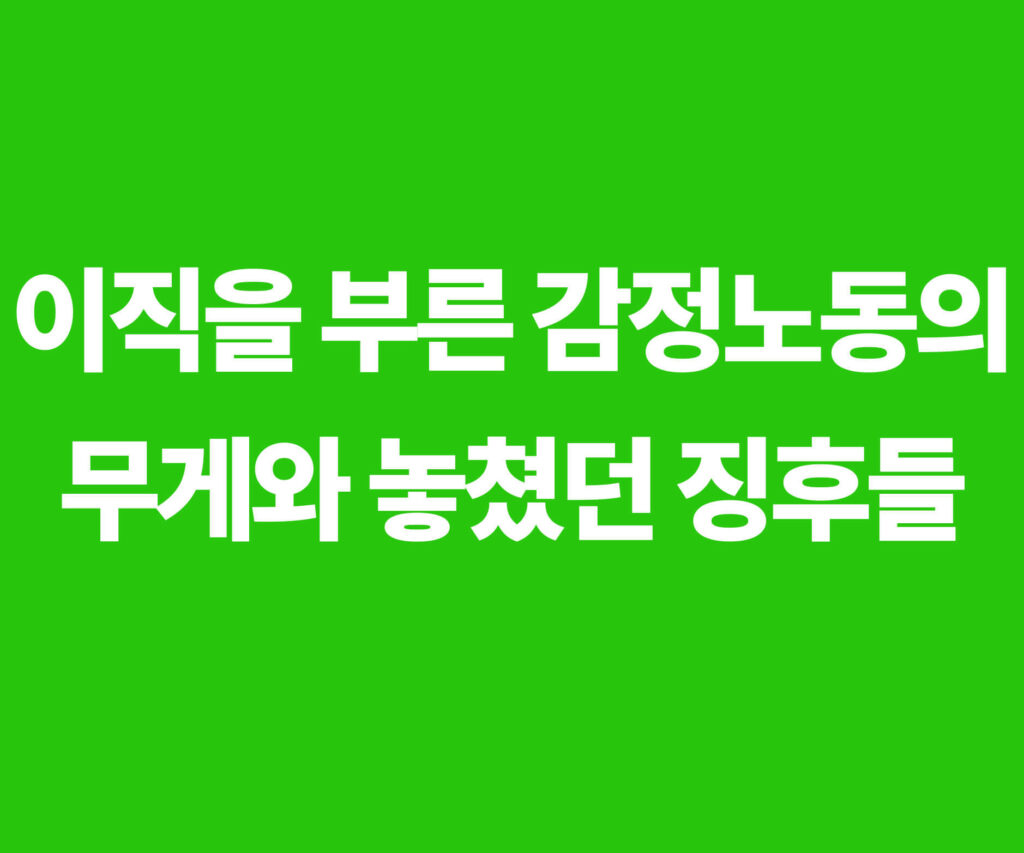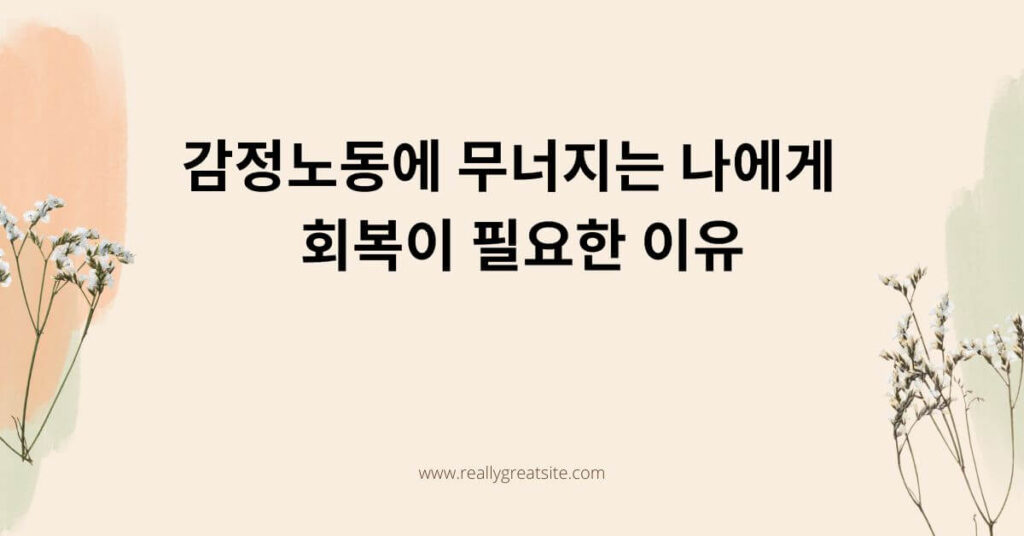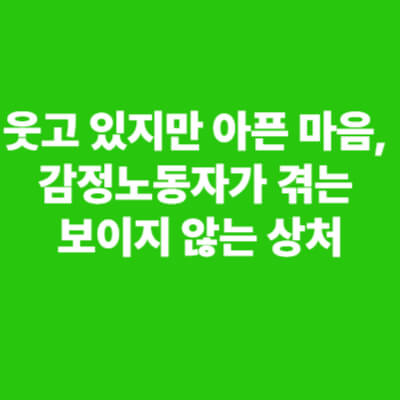작성일: 2025년 8월 5일
감정노동 속 이직 고민 –
왜 나는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
감정노동이 일상이 되어버린 직장 속에서 내가 놓쳤던 이직의 신호들. 왜 그날 나는 그만두고 싶었을까. 이 글은 한 사람의 내면 고백을 통해 감정노동의 무게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1. 지쳐간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처음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던 날은, 생각보다 오래전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속이 메스꺼웠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데 집중했다. 일이 힘들다기보단,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너무 버거웠다. 누군가의 불만을 들어야 하고, 억지로 웃어야 하고, 끝없이 감정을 조율해야만 하는 하루. 그날 나는 커피 한 잔도 끝까지 마시지 못한 채 눈물이 났다.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
2.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무너졌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해지고, 동료의 무심한 표정에 상처받곤 했다. 상사의 무표정한 얼굴은 내가 또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고객의 짜증 섞인 말투는 나의 하루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사소한 일이 크게 다가오고, 그 감정이 나를 덮칠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자책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예민함이 아니었다. 내 안의 감정 에너지가 이미 바닥났던 것이다. 감정노동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소진.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3.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건,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누구를 만나도 기계처럼 웃고, 어떤 상황에도 습관적으로 반응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무덤덤했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억누르게 됐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내 모습에 스스로도 낯설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기분. 감정을 소비하는 직무 특성상, 감정의 ‘OFF 스위치’를 켠 것처럼 무뎌졌다. 누군가 “요즘 왜 이렇게 무표정해?”라고 말해줬더라면, 나는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4. 어느 순간, 출근길이 고통이었다
버스에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하차 버튼을 누르면서도,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업무보다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더 괴로워졌다. 특히 고객과의 마찰이 있는 날이면, 손이 떨리고 목이 마르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다. 그건 단순히 일이 힘든 게 아니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내 안의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켜져 있었던 것이다.
5. 그만두고 싶다는 말, 왜 쉽게 꺼내지 못했을까
내가 겪는 감정이 일시적이라 생각했고, 다들 이 정도는 견디며 사는 줄 알았다. 주변에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약해 보일까 봐, 무능력해 보일까 봐. 그러다 보니 나는 계속해서 버티는 쪽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나와 비슷한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기 힘들다면, 이미 신호는 와 있는 거라고. 그건 회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직감이다.
6. 지금은 나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결국 나는 용기를 냈다. 회사를 떠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감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엔 허무했고, 후회도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를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매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정노동은 어느 직업에나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다짐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 자신을 먼저 살피겠다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