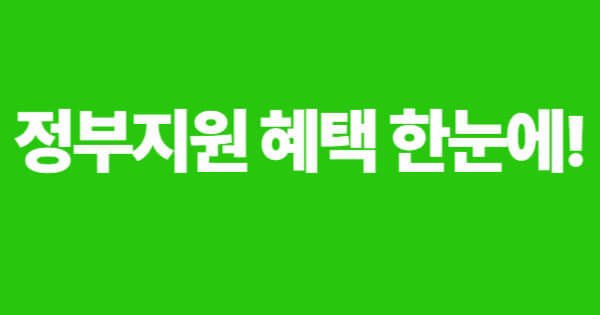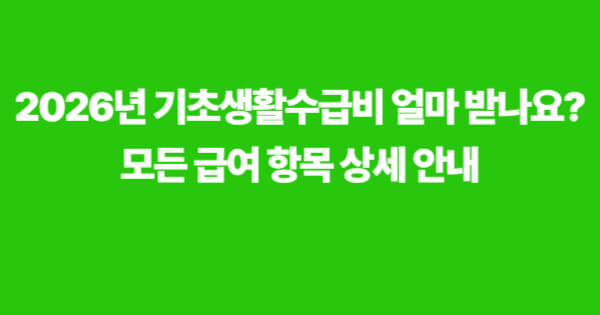작성일: 2025년 10월 26일
모든 진실에는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편안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김민준은 그 어둠의 끝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자가 되어 세상 앞에 섰고, 숫자로 불렸던 이들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와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 목차
- 다시 불려진 이름
- 언론의 문턱
- 침묵의 벽
- 목소리의 힘
- 세상을 향한 증언
1. 다시 불려진 이름
플래시가 번쩍였다. 회의실 안에는 낯선 언어가 교차했고, 벽에는 “INTERNATIONAL HUMAN RIGHTS FORUM”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민준은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이름표에는 ‘KIM MINJUN, SURVIVOR’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 생존자, 김민준 씨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대신, 그곳에서 죽어간 이들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었다.
“저는… 이름을 잃은 채로 412일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을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제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순간 멎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저는 7번이 아닙니다.
20번, 14번, 그들은 제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캄보디아의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생존자’에서 ‘증언자’로 바뀌었다.

2. 언론의 문턱
귀국 후, 그는 여러 방송국의 인터뷰를 받았다.
그러나 제작진의 질문은 늘 비슷했다.
“거기선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범죄 조직의 실체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의 진실’이 아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당신들이 듣고 싶은 건 피와 고통의 묘사겠죠.
하지만 나는 그걸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려는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직접 카메라를 들었다.
낡은 핸드폰으로 자신이 본 현실을 하나씩 기록했다.
그가 만든 영상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우린 아직 그곳에 있다.”
그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같은 곳에 있었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이어지는 인간의 울음 속에 있다는 것을.

3. 침묵의 벽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는 새로운 벽을 마주했다.
국가는 침묵했고, 사람들은 냉담했다.
댓글에는 “왜 그런 곳에 갔냐”, “본인 책임이지”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했다.
“진실을 말했는데, 세상은 왜 귀를 닫는가.”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들의 무관심이 곧 또 다른 폭력임을.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곳의 소리, 그날의 냄새, 함께 탈출하지 못한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저도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증언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저도 말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민준은 울었다.
그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4. 목소리의 힘
그의 영상은 점점 확산되었다.
국제 NGO들이 연락해왔다.
“당신의 증언이 다른 생존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인권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말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CNN, NHK, BBC, 그리고 한국의 공영방송까지.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언어’가 되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왜 다시 그 고통을 말합니까?”
그는 대답했다.
“누군가는 아직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올 때까지,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5. 세상을 향한 증언
몇 달 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를 초청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다시 말했다.
“나는 살아남았기에, 침묵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었다.
그의 말은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법정 증거로 채택되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약이 맺어졌고,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 뉴스를 보았다.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피해자 57명 구출.”
그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누군가가 들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기억의 그림자가 다시 스쳤다.
동료 박성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형, 네가 살아남으면… 꼭 말해줘.
우린 존재했다는 걸.”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바람이 불었고,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다.
“이제 세상이 들을 차례야.”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증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세상에 남긴 진실의 기록이었다.

📌 요약 메시지
〈캄보디아 증언록〉 9화는 “말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현실을 고발하며,
피해자의 자리에서 증언자의 자리로 옮겨 선 인간의 용기를 보여준다.
그의 말은 단지 고백이 아닌, 다른 생명을 구한 행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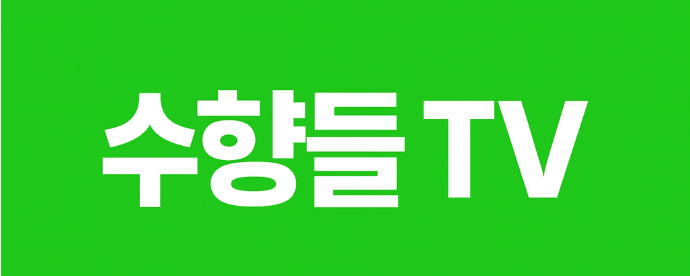

![[캄보디아 증언록] 9화 증언 – 세상에 말하다를 표현한 대표 이미지](https://maiisa100.com/wp-content/uploads/2025/10/9화는-〈증언-–-세상에-말하다〉0-0-1024x5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