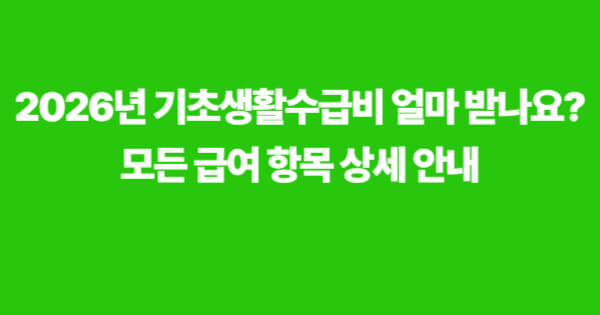작성일: 2025년 10월 25일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빛을 본다.
김민준에게 그 빛은 ‘벽 너머의 불빛’이었다.
이곳에서 이름은 숫자로 대체되고, 숨소리조차 감시당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가 본 작은 불빛 하나가 절망의 감옥을 뒤흔든 희망의 신호가 되었다.
〈캄보디아 증언록〉 3화는 어둠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마지막 본능’을 그린다.
■ 목차
- 침묵의 감금소
- 절망의 일상, 반복되는 교육
- 불빛, 그 시작의 신호
- 벽 너머의 존재
- 희망이라는 금지된 단어

1. 침묵의 감금소
철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 울렸다.
민준은 숫자 20번으로 불렸다.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일어나 한 줄로 섰다.
밥은 식은 밥 한 숟가락과 김치 한 조각.
식사 후에는 헤드셋을 끼고 전화기를 붙잡았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말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점점 ‘고객님’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해졌다.
그저 생존을 위한 노동, 명령에 의한 반복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실적’과 ‘번호’만 남았다.
2. 절망의 일상, 반복되는 교육
그날도 교육은 잔혹했다.
실적이 낮은 14번은 밥을 받지 못했다.
경비원은 그의 어깨를 밀치며 말했다.
“실적이 곧 생명이야.”
민준은 그 말을 외웠다.
‘실적이 생명이다.’
그 문장은 이 감금소의 신조이자 저주였다.
그날 밤, 민준은 벽에 기댄 채 잠들지 못했다.
숨죽여 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새어 나왔다.
누군가는 가족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는 “살려달라”를 반복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울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3. 불빛, 그 시작의 신호
새벽 2시.
민준은 희미한 빛을 보았다.
창살 틈 사이, 먼 숲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처음에는 환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불빛은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세 번, 멈추고, 다시 다섯 번.
“성호야, 저거 봐.”
민준이 속삭이자, 22번 박성호가 다가왔다.
“무슨 신호 아니야?”
둘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 불빛은 그날 밤에도, 다음날 밤에도 같은 리듬으로 깜빡였다.
그들은 알았다.
누군가가 ‘살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4. 벽 너머의 존재
며칠 뒤,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번호는 7번이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불빛, 선교사야.”
“선교사요?”
“그래, 오창수 목사. 한국인이지. 우리를 알고 있어. 탈출을 돕고 있어.”
민준은 믿기지 않았다.
누군가 이 지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살아 있는 누군가가 밖에서 기다린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잠을 잤다.
그 불빛을 꿈속에서도 봤다.

5. 희망이라는 금지된 단어
‘희망’은 금지된 단어였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 없이 살 수 없었다.
민준은 매일 새벽, 창문 틈으로 불빛을 기다렸다.
그 불빛이 다시 세 번, 다섯 번, 열 번 깜빡일 때마다
그는 속삭였다.
“포기하지 말자.”
그날부터 민준의 눈빛은 달라졌다.
두려움이 아닌 ‘생존의 의지’가 깃들었다.
절망의 벽 안에서도, 그는 벽 너머의 빛을 바라봤다.
그것은 누군가의 신호였고, 동시에 자신의 구원이었다.


![[캄보디아 증언록] 3화 벽 너머의 불빛 – 절망 속의 신호를 표현한 대표 이미지](https://maiisa100.com/wp-content/uploads/2025/10/캄보디아-증언록-3화-3-1-1024x5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