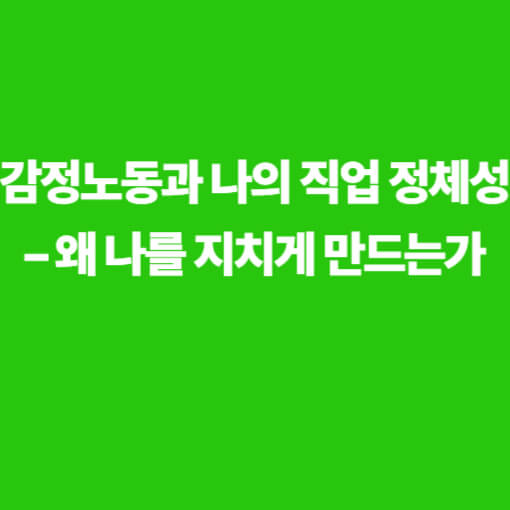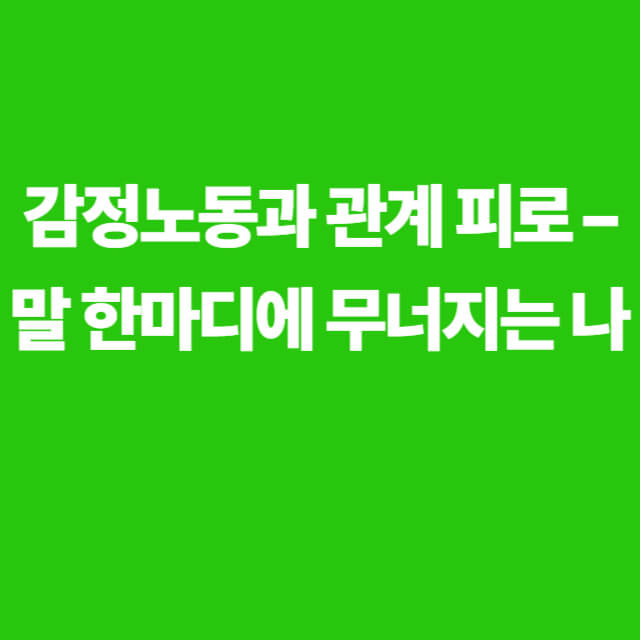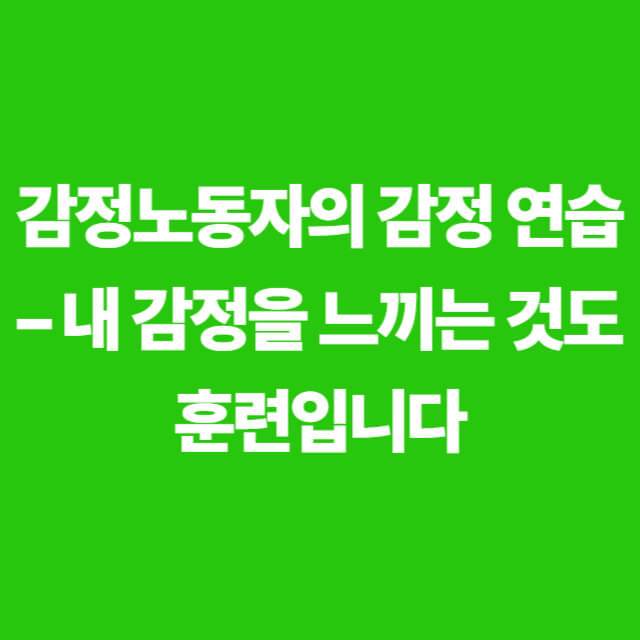작성일: 2025년 8월 3일
1. ‘괜찮은 척’이 일상이 된 나
나는 매일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한다. 직업 특성상 미소를 지어야 하고, 상냥한 말투를 유지해야 하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선 안 된다. 고객의 불쾌한 말도 삼켜야 하고, 동료의 부당한 처사도 가끔은 외면해야 한다. 그런 나의 하루는 늘 ‘괜찮은 척’으로 시작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으로 끝난다. 웃는 얼굴 뒤에는 꾹 누른 분노와 피로가 남아 있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에너지와 마주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직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기분이다. 감정을 숨기고, 인격을 포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웃고 있지만 나는 슬펐다
웃는 얼굴은 나의 무기이자 갑옷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인사말을 반복하고, 고객의 감정에 맞춰 목소리를 조절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 연기하면서, 나는 점점 ‘내 감정’이 무엇인지 잊어갔다. 무언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화낼 수 없었고, 억울해도 참아야 했다.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무표정이 습관이 되었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정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이제는 감정을 잃어버리는 일로 변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고, 몸은 피곤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슬펐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3. ‘직업’이 나를 집어삼키다
감정노동은 단순히 일의 피로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 쏟아붓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동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더 노력하고,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려 무리한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스스로를 ‘일하는 나’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퇴근 후에도 휴대폰 알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말에도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은 결국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무력감으로 돌아왔다. 직업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지금은 직업이 나를 선택한 듯한 기분이다. 내 이름보다 직위로 불리는 횟수가 더 익숙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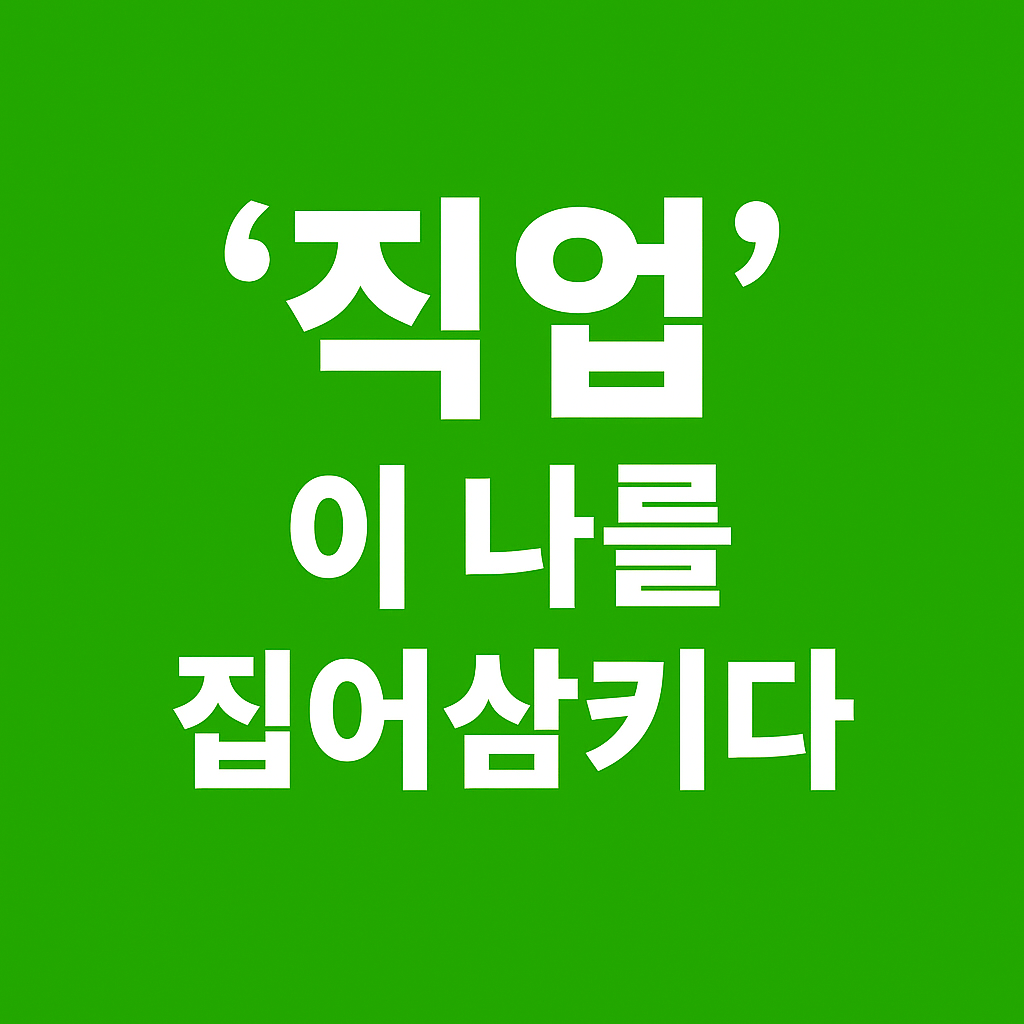
4. ‘감정’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감정노동이 힘든 이유는,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잊게 만드는 데 있다. 처음엔 연기처럼 감정을 조절했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니 나는 진짜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상사의 날카로운 말에 눈물이 났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지금껏 내 감정을 부끄럽게 여겼고, 감정을 표현하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서야 인정하고 싶다. 감정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은 내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다.
5. 나를 회복하는 가장 솔직한 방법
무기력과 지침이 나를 점령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트에 내 감정을 적으며, 나는 조금씩 회복의 단서를 찾아갔다. “오늘은 힘들었다.” “나는 억울했다.” “이 일이 나를 아프게 했다.” 이 짧은 문장들이 나를 구했다. 직장에서의 나는 항상 단단해야 했지만, 적어도 나와 마주하는 글 속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렇게 나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6. 감정노동자를 위한 ‘존중’이라는 회복
우리는 흔히 서비스직, 의료직, 교육직, 돌봄직 등에서 감정노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감정노동자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나 역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배려 하나에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었다. 감정노동이 덜 힘들어지는 순간은, 내가 누군가의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을 때다. 앞으로 나는 나를 더 챙길 것이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더 크게 할 것이다. 나의 직업은 내가 선택했지만, 나라는 사람은 직업 이상으로 소중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