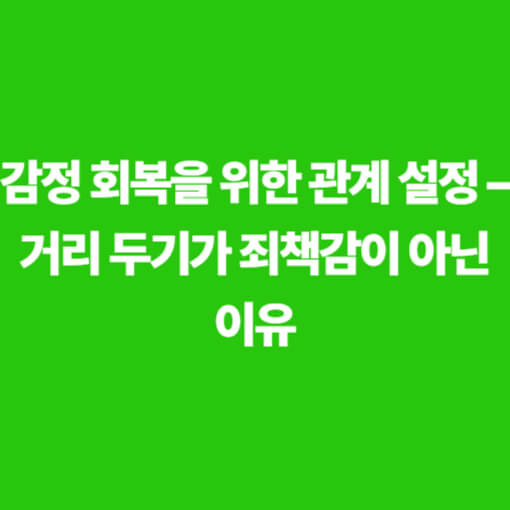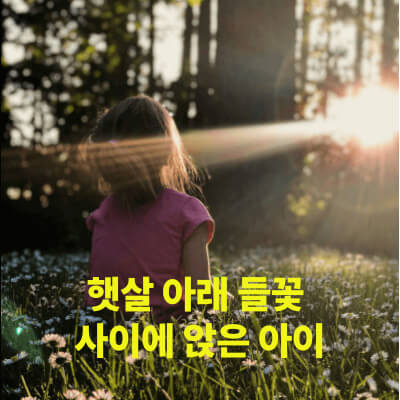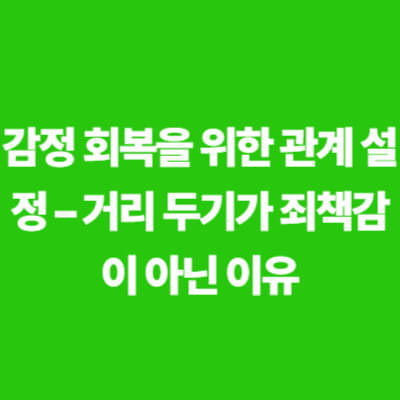작성일: 2025년 7월 21일
감정노동자는 관계 속에서 늘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역할에 익숙해지다 보면, 관계에서 물러서거나 거리를 두는 일이 곧 죄책감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에 오랫동안 눌려 살아왔고, 거리를 두는 선택이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망설인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거리 설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감정노동자로서 제가 겪어온 관계 피로와, 거리 두기가 어떻게 회복의 첫 걸음이 되었는지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1. 나는 왜 끝까지 버티려고 했을까 – 관계 속 ‘좋은 사람’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감정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늘 ‘좋은 사람’이라는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업무에서는 고객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동료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 감정을 조절했고, 가정에서는 피곤하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역할에 익숙해진 저는 관계 속에서조차 쉽게 멀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피로해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도 끝까지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관계를 끊는 건 나쁜 일이라는 생각,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죄책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좋은 사람’ 역할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웃으며 맞장구를 치고,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서도 애써 넘기며 살았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조차 말하지 못한 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는 일은 버릇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만 조금 더 참으면 돼’라는 식의 자기 설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점점 더 억누르고, 감정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감내하고 있었고, 그 무게가 결국 감정적 탈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2.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리 두기가 더 어렵다
감정노동자로 살아오며 저는 관계 안에서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가 좀 참아”,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고, 어느 순간 저는 그 말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제 감정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도 많고, 실망도 깊어집니다. 저는 불편한 말을 꺼내는 대신 웃었고, 지친 기색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반복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니라, 그 관계가 제 감정을 돌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 두기는 그런 관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가까울수록 거리 두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히려 잠시 멀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처음 거리를 두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밀려든 감정은 안도감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상대는 나쁜 의도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감정노동자로서 늘 남의 감정을 먼저 배려해온 습관이, 제 감정을 지키려는 시도마저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죄책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와 관계 안에서 기대된 ‘착한 사람’의 틀, 갈등을 피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분위기, 감정 표현은 곧 예민함이라는 오해가 만든 틀이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조종하는 말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거리 두기는 회피가 아니라 회복이고,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돌봄이라는 것을.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니, 비로소 제 감정에 집중할 수 있었고, 관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4.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고 하면 곧잘 단절이나 외면으로 오해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이 배신 같았고,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 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규칙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자율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매일 마주치더라도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리 없는 가면극일 뿐입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를 지치게 했고, 어떤 행동이 반복되는 상처였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짜 멀어지는 건, 거리를 두지 못해 계속 상처받는 사이입니다. 관계는 거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의 거리 두기는 오히려 마음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5. 감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경계, 그리고 회복의 시작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저는 제 삶에 처음으로 감정의 경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구의 말도 쉽게 받아들이고, 기분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에 경계를 세우며,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말과 멈춰야 할 말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돼요’,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같은 표현을 꺼내는 것이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저는 덜 지치기 시작했고,
나를 지키는 말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정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거리 두기, 작은 표현의 반복,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난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일상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감정을 눌러두는 대신, 말하고, 멈추고,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감정노동자의 회복은 그렇게, 관계를 다시 배우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 감정노동 칼럼 시리즈 전체 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감정노동 칼럼 시리즈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