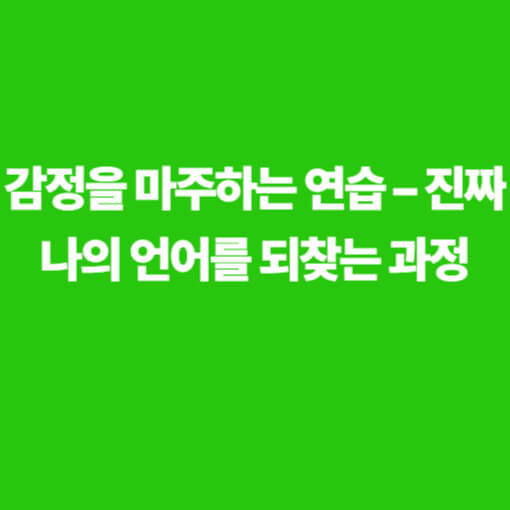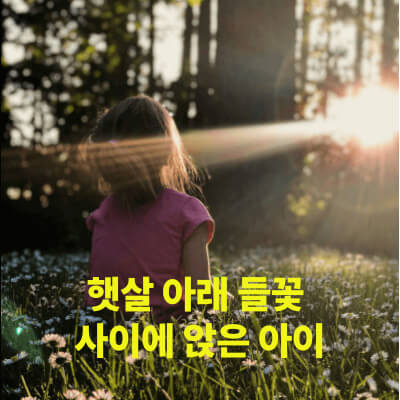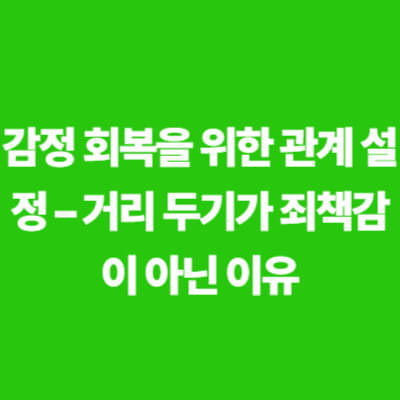작성일: 2025년 7월 15일
회복의 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마주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감정노동으로 무뎌졌던 나를 다시 깨우는 이 여정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1. “이 감정은 내가 아닌 줄 알았다” – 무감각했던 나의 상태
화가 나도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고, 슬픈 일을 겪어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게 “감정이 무뎌진 것 같아”라고 말할 때면,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애매하게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내 안에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분명 있었지만, 그걸 꺼내는 데에는 늘 주저함이 앞섰습니다. 말하는 순간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감정을 드러냈다가 되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내 감정을 그저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표정은 무표정해졌고, 입버릇처럼 “괜찮아요”라는 말을 달고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은 정말 괜찮아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며 억지로 버티는 견딤이었고, 그 견딤은 조금씩 나를 고장 내고 있었습니다. 나조차도 내 감정을 외면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는 내 감정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복은, 그 멀어진 감정을 다시 마주하려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2. 감정을 회피하는 습관 – 익숙했던 생존 전략
감정을 피하는 건 나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다 보니,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건 곧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았고, 그 약점은 언제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표현했다가 되려 오해받거나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쌓이면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나는 늘 ‘좋은 사람’, ‘갈등을 피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불편해할까 봐 내 감정을 미리 숨겼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행동이 성숙하고 배려 깊은 거라고 나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건 결국 내 마음을 외면하는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려 하면 자연스럽게 딴 생각을 했고, 억울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며, 눈물이 차올라도 참아내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피하는 것이 어느덧 내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색해졌습니다. 참는 게 잘하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프로다운 거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점점 나 자신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없앤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깊이 고여서 내 안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회복은 결국, 그 익숙했던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나를 이해하면서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다짐하는 데서 다시 삶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 조용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회복의 실마리는 아주 작고 조용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 짧은 문장이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렇게 서툴고 어렵다는 사실에 나도 놀랐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꾸 멍해졌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그저 아무 느낌도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눌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끄집어내기보다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일기를 써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슴이 철렁했는지, 언제 숨이 턱 막혔는지, 누구의 말에 마음이 쿡 찔렸는지를 조심스레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말로 붙잡으려 애쓰다 보니, 아주 조금씩 내 마음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다’, ‘억울했다’, ‘서운했다’, ‘속상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안의 어린 자아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그 아이는 울고 있었고, 나는 그 울음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거창한 분석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표현할 줄 몰라서 더 괴로웠던 감정들이, 이름을 갖게 되자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군가 “그랬구나”라고 말해주기 전이라도,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4. 나의 감정에 말을 건다는 것 – 표현은 치유의 시작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인 다음부터는, 그 감정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속상했구나. 그럴 수 있어.” “너무 억울했지. 말 못 해서 답답했겠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곧 내가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타인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돈되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마음을 졸였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울음을 꾹 참고 입을 다물고 싶은 순간이 있고, 여전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넘기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때론 울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며, 아주 천천히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말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꺼낸다는 것은 내 마음을 존중하는 행위이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해 온 내 감정에게 늦은 사과를 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는 용기라는 것을 압니다. 감정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감정을 다시 불러오며 살아가는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지 회복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문장
이제 나는 더 이상 괜찮은 척만 하며 살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이 연습이, 조금 느리더라도 가장 나다운 회복의 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내 언어가 되고, 내 삶의 온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내 마음에 말을 겁니다.
📌 감정노동 칼럼 시리즈 전체 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감정노동 칼럼 시리즈 모아보기